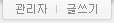2006년 3월 29일 KAIST 이사회는 총장의 2년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 그리고 총장은 이를 수락했다. 그리고 그는 7월 14일을 끝으로 미국 Stanford Univ.에서 다시 교수로 살아갈 것이다. 모두가 KAIST의 히딩크라고 했던 로버트 러플린 현 KAIST 총장의 이야기이다. 물론 러플린 총장은 자진 수락의 형태로 최대한 아름다운 퇴진을 만들었지만 사실을 들여다본다면 이 사건은 아름다운 퇴진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 이미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거쳐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총 23명의 KAIST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학과장, 학장의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이사회가 포기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충돌이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협의회의 가장 주된 반대 요인은 KAIST를 종합대학화하려는 러플린의 노력이었던 것같다. (물론 잦은 해외휴가로 인한 2006학년도 입학식 불참(?!), 행정 경험 전무, 지나친 중국과의 교류 추진, 10분간의 면담을 통한 연구비 책정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KAIST는 모두가 알다시피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다. 엘리트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 바로 이 곳이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설립한 연희학당, 국가에서 식민통치를 위해 설립한 경성제국대학과는 다른 특유의 목적이 존재했고 지금까지 그 목적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국가의 중심인 서울이 아닌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30만평이 넘는 공간에 설립되어있다. 그런 곳이 바로 KAIST이다.과학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기술만을 연구하는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KAIST이다. 점점 세상은 변해간다.그 변화에 무관심한 KAIST가 아니다. 그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경영 전문 대학원과 금융 전문 대학원을 설립한 대학이 KAIST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외국인 총장을 임명한 곳이 바로 KAIST이다. (KAIST의 외국인 총장 임명이 미친 상징성은 다른 대학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곳, 변화에 앞서가는 곳이 되기 위해 KAIST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런 과학의 전당이 KAIST이기에 이번 일은 대외신인도의 타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 그 이상을 담고 있다. 결국 과학은 이제 학문 그 자체가 되었다. 과학을 위해 세워진 공간이라면 예술, 문학, 인문학도 차별하지 않고 과학의 전당인 KAIST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은 점점 그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과학이라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KAIST라면 모든 학문은 이 곳 대전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Medical School이나 Law School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보아야한다. 오히려 이런 학교들이 학교에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KAIST는 과학기술자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Medical, Law School이라면 KAIST는 앞장서서 그런 이들을 양성할 준비를 해야된다. KAIST라는 집단을 위해서는 KAIST 출신의 과학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KAIST출신의공무원, KAIST 출신의 판사, KAIST 출신의 국회의원도 필요하다. 서울대가 앞서나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실력과 그 실력을 이용할 수 있게해주는 연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KAIST 졸업생이 고생을 한다면 그것은 실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밀고 당겨주기에는 아직 사회의 연줄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연줄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연이라는 것이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후배라는, 자신의 선배라는 정을 어찌 무시할 수 있단말인가? 자신의 친구가 하는 사업이 힘들 때 무관심하게 쳐다볼 수 있는 무심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높은'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KAIST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과학자가 될 수는 없다. 아니 그런 일은 인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과학자 못지 않게 좋은 사회인, 좋은 국회의원, 좋은 공무원, 좋은 경영인, 좋은 의사, 좋은 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KAIST라는 집단에서 꼭 좋은 과학자만을 만들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KAIST가 어떤 길을 걸어야하는가?
<'사용중지 >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6학년도 봄학기 시간표 (2) | 2006.04.06 |
|---|---|
| Quiz에서 쓴 맛을 보지 않는 방법 (2) | 2006.04.03 |
| STP (0) | 2006.03.26 |
| '곱게는 못내' ?! (3) | 200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