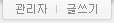¿Barcelona en España? Barça a Catalunya!
아는 것이 딱히 없는 이 도시에서 일단 출발은 Sagrada Família로 향했다.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슝슝.
일단 지하철에서 놀랐던 것은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이런 핸드폰 악세서리를 판다는 점.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는 광고 현수막에서(! 이건 서울 지하철이 현재 전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불가능하다.) 초단위로 지하철이 오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분 단위도 아니고 초 단위라니.
그런데 분명 난 9시도 되지 않아서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짧지만 줄을 서있다. 이 공사중인 성당이 뭐가 좋다고 다들 줄을 서있는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공사중인 건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줄이 그닥 긴 편은 아니어서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하고 입장하는데 15분도 안 걸렸다. ^^
원래 내가 처음 이 성당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 성당은 19세기부터 짓기 시작했고, 완공은 22세기가 되어야한다고 봤었는데 요즘 보니까 가우디 서거 100주년인 2026년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가우디가 만든 이 성당의 설계도에는 이 모든 것이 부조까지 전부 들어있었던 거란 말인가? 정말 대단하다.
저 기둥 4개가 이 성당의 상징이다.
성당 내부는 높은 기둥으로 쭉쭉 올라가 있어서
덕분에 보기만 해도 충분히 넓어보인다. 물론 저 구멍이 약간 으.... 그 이상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더구나 바르셀로나의 태양, 흰색 기둥이 합쳐지니 실내가 정말 밝다. 사실 이렇게 밝은 성당은 가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다.
성당 투어로 위쪽으로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엘레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려면 티켓을 미리 좀 더 비싼 걸로 사야된다. 이 티켓 가격으로 지금 이 성당이 지어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성당이 다 지어지면 여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건가? 여튼 올라갈 때만 엘레베이터가 있고 내려갈 떄는 걸어서 알아서 내려가야한다. 올라가면, 성당 기둥의 부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럽 여행을 아무리 해봐도 성당에 이런 색부조가 있는 건 처음 봤다. 쾰른 대성당이랑 비슷하면서도 극과 극의 느낌을 준다.
특히 부조가 자세히 표현되어있고, 테마가 있게 잘 묘사되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물론 이 공사는 언제 끝날줄 모르는 공사다.
대충 보면 성당을 짓는데 이런 대형 크레인이 몇 대씩 동원되고, 석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 것 같다. 정말 현대적이라서 뭔가 새로운 느낌인데 진짜로 그렇게 짓는지는 잘 모르겠다.
참고로 투어는 이렇게 계단을 걸어내려오면서 진행된다. 올라가고 와서는 데굴데굴... 내려가지요.
요기 글자같기는 한데, GLORI#E?
격자형 Eixample.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미국이 Street와 Avenue로 격자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배우는데, 진짜 그리드형 도시는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오.잉. 엘레베이터 투어가 끝났다. 덕분에 바르셀로나 시내를 맑은 날에 한 눈에 내려다보고 다시 성당 중앙으로 복귀.
다시 내려오니 이미 사람이 한참 많다.
사람들이 열심히 원래 미사보는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멀리 나의 사랑 파이프오르간도 보인다. 물론 내가 있을 때 집전이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저 십자가에 박힌 예수상과 오묘한 스테인드글라스의 향연을 보며 유럽 여행에서의 성당의 위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의자에서 아픈 다리를 잠시 쉬어주었다.
나중에 이 성당이 다 지어지고 나서, 제대로된 세계유산이 되었을 때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빌어보며, 다음 목적지를 찾아 길을 걸었다.
일단 딱히 목적지는 없고 성당 맞은편 광장 근처에서 대충 배를 채우고는 Passeig de Gràcia를 향해서 쭉 걸었는데, 걸어가다가 소매치기?도둑한테 털릴 뻔 했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털린 적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대놓고 티가 나긴 했다. 주렁주렁 카메라를 목에 걸고 손에는 관광책을 잘라내서 들고 다녔으니 누가 봐도 관광하러 왔군.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녔는데, 누가 이런 나에게 대놓고 지도를 들고 누가 길을 물어본다고 다가왔다. 왜 뻔히 가까운 Sagrada Familia를 묻는 거지?, 여튼 그래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낚인 것에 대한 감이 없었다.) 갑자기 누가 경찰이라며 다가온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둘 다 무시하고 그냥 앞을 보고 다시 갔다. 뭔가 자기들끼리 연극을 꾸민 모양인데, 왠지 내가 경찰이 오면 당황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 할 뿐이다. 물론 만의 하나정도의 확률로 진짜 경찰일 수도 있는데, 불러세우지 않은 모양으로 봐서는 상황극이 분명해보인다.
그렇게 Passeig de Gràcia에 도착하자 보이는 이 건물은 Gaudi가 만든 Casa Milà (La Pedrera). 특유의 곡선으로 직선이 없으며, 특히 저 발코니의 철제 난간은 예전에 철을 다루던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 직접(!)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물론 입장료가 있는 관계로, 저런 곳에 다 들어가면 비싸니까 패스. 근데 주변에 줄도 길고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따 저녁에 내려가면서 건물 하나를 콕 집어서 거기만 들어가보기로 했다.
가다가 보게된 거리의 의자인데, 거리의 의자가 곡선이라서 그냥 한번 찍어봤다.
길을 따라 좀 더 내려가면 Casa Batlló가 나온다. 여기도 역시나 사람이 많다.
진짜 길거리 의자가 이런 예술작품이라니. 그냥 물 건너온 사람이 느끼는 사대주의인건가라고 하기에는 이런 투자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사실 근처에 다가보았는데 건물이 5층이 넘어가는 관계로 절대 가까이에서 저 건물을 통으로 담을 수가 없다. 게다가 가로수 덕분에 건물은 다 가려준다.
드디어 다시 도착한 Plaça de Catalunya. 그러나...
이곳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둘기 세상으로 이미 비둘기에 점령당했다. 저 비둘기들이 종종 한번에 날아오르는데, 한번에 비둘기에 푸드덕푸드덕거리면서 날면. 무.섭.다. 인터넷에서 보던 메뚜기 습격 저리가라다.
이게 다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있어서 그런거다. 정말 얼른 여길 떠야겠군이라는 생각만 가득해진다.
그렇게 Ramblas 동쪽의 El Barri Gotic에 들어갔다. Eixample이 계획된 격자형 도시라면, Gothic Quarter는 말그대로 구시가지다. 이런 골목길이 정겹게? 어지럽게? 펼쳐져있다. 굳이 서울에 비교하자면, 이태원 주변길을 Gothic Quarter에, 강남을 Eixample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부터 고대 도시인 Barcelona가 시작된다. 저 오른쪽 길에서부터.
그 전에 무료 입장 시간에 맞추어서 대성당에 들어갔다. 역시나 앞의 너른 광장에는 사람이 많다.
가이드북에 의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니, 그 입장시간의 10분쯤 전에 들어갔는데, 난 들어간 사람은 쫓아내지 않는 구조인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시간에 다시 개방하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10분 이상 구경하려면 다시 돈을 내고 들어와야하는 아름다운 상황이다.
덕분에 모든 사람이 입구를 향해서 걸어거고 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성당에 갔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고딕 양식 성당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 매너리즘에 확 빠진 나로서는 힘든 일이다. 여튼 높게 뻗은 중세시대 건물이니까, 미술사 시간에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아직 배운 걸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Ramblas로 길을 나선다.
그렇게 도착한 Plaça Reial, 사실 여긴 밥 먹으로 갔다. 10월 초의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이 도시에는 야자수(!)가 있다니. 여튼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었다. 점심 코스가 €10 정도 된다.
그리고 도착한 Palau Guell. 굳이 해석하면 궁전인데, 어 분명 가이드북에는 입장료가 무료였는데 입장료가 써있다. 이건 뭐지. 낚였다. 그러나 여길 온 덕분에 Doner를 파는 가게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꿩이 아니어도 닭은 건졌다.
그렇게 거리의 끝까지 내려왔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지중해가 시작된다.
오 그런데 저긴 뭐지? 약간 Santa Monica에서 보던 Pier Park가 생각나는 구조인데, 물론 거기처럼 놀이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먹이를 먹으러 다가오는 물고기와
엄청난 수의 정박된 요트들이 즐비한 이곳은, 구 항구인 Port Vell.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건 항구가 아니라 Maremagnum 쇼핑몰 뿐이다.
사실 안에서 돌아다녀보니 영화관까지 있는 것이 서울의 대형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차도 반대쪽으로 들어오고, Ramblas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이 구름다리를 만들어놓은 모양이다.
참고로 저 많은 요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여기 하나라, 오가려면 이 구름다리가 움직여야하는 모양이다. 은근히 이거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는 관계로, 이 동영상으로 대체한다.
근데 저 여유로운 곤돌라는 뭐지? 여길 뭘 보겠다고 다니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정말 관광용으로 왔다갔다하는 느낌인데.
오늘 정말 열심히 걸어다니는지라, 다음 목적지는 진짜 바다, 해변이다. 사실 Maremagnum을 넘어서 가도 되었는데, 정말 인도가 뚫려있는 지를 몰라서 거의 왔다가 다시 돌아나와서 야자수가 펼쳐진 긴 길을 따라 걸었다. 분명 지도로는 가까워보이는데 직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 빙글 돌아서 가야한다. 덕분에 근처 마트에서 과자랑 아이스크림도 사서 먹으면서 해변에 도착.
드디어 도착한 대도시의 해변, La Barceloneta. 분위기는 Santa Monica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막상 바다에 가자니 난 짐 지켜줄 사람도 안 데리고 오고, 수영복도 없다.
현재 기온은 25℃, 해변의 분위기는 따사로운 햇살 덕분에 여름 저리 가라다. 몸매도 좋은 이쁜 누님들이 비키니 입고 계신 좋은 곳인데, 아 나는 물에도 제대로 못 들어간다니. 수영 배워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물에 발 담궈보고는 그냥 해변 의자에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감자칩을 까먹고 있었다. 대체 해변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람.
참고로 이 해변이 엄청 길다. 이름도 3개나 붙어있었는데 덕분에 빠져나올 때도 쓸쓸함이 3배나 된 듯, 여튼 혼자서 잘 걸어나왔다.
내가 파리로 떠나면 이런 축구경기도 한단다. 물론, 어차피 여기에 있는다고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Barri Gotic으로 돌아왔다. 제대로 골목길을 걸어다니니 Eixample과 다른 이 느낌은, 사실 지구로 처음 들어올 때는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닫힌 가게 앞에 그려진 그래비티 때문에 약간 무서운기가 났지만, 조금만 들어오면 걸어다니면서 구시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심이다.
여기는 대성당 바로 뒤쪽의 Plaça del Rei. 그 옛날 콜럼버스가 항해를 끝나고 보고를 하던 광장이란다. 즉, 여기는 왕의 살던 건물이라는 뜻.
참고로 Barcelona 이곳 저곳을 돌아다보니, 저런 점박이로 장식된 건물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장식이 된 음악당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걷다보니 발이 아파온다. 배는 고파오고. 확인을 하니 발등은 부어오르고, 발가락 아래쪽으로 큰 물집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 겸으로 Calalunya 근처 쇼핑몰에서 밴드를 사(면서 젤리도 사)고, 숙소를 중심부에 잡은 터에 숙소에서손톱깍기를 이용해서 밴드를 잘 붙였다. 그렇다고 발등이 부어오른 걸 막을 수는 없을 터. 그러나 부어올랐다고 걷기를 그만두면 앞으로 남은 10일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참아보기로 했다.
여튼 난 다시 길을 나섰다. 아까 보았던 Gaudi의 건축작품 중 하나를 직접 안에서 보기로 계획한 나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Casa Batlló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Passeig de
Gràcia를 따라 걸으며 귀여운 아이를 보고, 나는 Oxford에 있는 가영이랑 전화를 해서 방문 confirm도 하고, 몇시쯤 오라는 언질도 받았다.
Casa Batlló는 정확히는 Gaudi가 지은 건물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란다. 하지만 건축코드인 자연과 곡선은 건물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다. 위에서 봤던 사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밖에서는 뼈? 골격과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안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안정적인 곡선의 느낌, 파란 하늘의 느낌이 강하다. 생각해보면 Gaudi가 이 건물들을 만들고 있을 때 Passeig de Gràcia는 그야말로 Barcelona를 대표하는 신작로였는데 그 길에 자신 특유의 느낌을 투영해서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을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다.
들어가자마자 올라가는 난산에서 느끼는 목제 난간의 부드러운 곡선. 생각해보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순간 Gaudi의 세계로 한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곡선이 중요해서 그런지 난로가의 의자도 버섯모양 곡선이고,
나무창문틀도 곡선이고, (장식도 물론 곡선)
문도(!) 곡선이다. 진짜 문도 곡선이라니.
물론 이 로비의 천장의 무늬도 곡선이 휘몰아친다. 세상에는 직선이 없고 곡선만 있다는 그의 철학이 녹아든 특유의 안정감이랄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곡선을 10년동안 보고 살면, 나의 경우에는 아무리 Gaudi라도 차라리 직선이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이 바다 느낌의 벽에도 비밀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았을 때 비슷한 색감의 느낌이 나도록 각 타일의 명도를 조절했단다. 그래서 밝은 조명을 직접 받느 가까운 타일은 색이 강하고 아래는 약하다. 처음 보고는 그런가보다 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약간 신기하다.
여기는 바깥의 작은 테라스? 정원으로 나가는 길인데. 이 건물이 큰길가에 있는 관계로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이런 넓은 사적인 공간을 두고 있다.
여기 작은 거북이 한마리
이것도 잘 보면 거북이?
아마도 Batlló는 가장 잘 나가던 거리였던 이곳에서 파티도 하고 연회도 열었을 것 같다.
대충 생각해봐도 저 위쪽에서 연회를 내려보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저 불 꺼진 공간이 비공개다.
이렇게 보니까 개별 타일의 색감의 차이가 확 난다.
바다의 느낌을 살리려고 채광을 신경써서인지 바깥의 빛을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천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있다.
용의 등을 보는듯한 옥상 지붕의 모습. 옥상에 설치된 굴뚝에도 세밀한 모자이크가 다 들어있는데, 장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예술작품이다. 굴뚝 위쪽은 산소의 역류를 방지하려고 막혀있는데, 덕분에 약간의 교회 천장의 느낌도 난다.
바깥쪽의 타일은 진짜 등껍질처럼 뾰족뾰족하지만 안으로는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바깥쪽 facade는 바깥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혼자서는 바깥에서는 불친절해도 안에서는 부드러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집안의 손잡이 하나하나에도 나타난 곡선을 함께 보았을때 말이다. 참고로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Gaudi는 직접 난간 하나까지 설계했고, Batllo 공간 안에서 가구도 판매하고 있는데, 가구 가격이 상상초월이다.
조명을 받으니 건물의 흰 facade가 정말 뼈, 골격구조처럼 보인다. 거의 마지막으로 나간터라 이제 바깥에도 사람이 많지 않다. 이제 남은 건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숙소로 돌아갈 시간. 하지만,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다.
지중해를 끼고있는 Barcelona에서 내가 알고있는 맛있는 Paella를 먹으러 아픈 발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Drassanes로 이동했다. La Fonda까지 이동한 건 좋았는데 들어가려고보니 2인분으로만 파는 Paella는 1인분으로 팔지는 않는단다. 에효. 고민고민하다가 여기 말고 옆집에는 1인분만 파는 것 같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안된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안 먹고 가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도 드디어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시킨 Sangria.
이게 은근히 취한다. 사실 혼자서 와인 1L를 시켜서 다 먹은 격이니까. 대놓고 많기는 한데, 솔직 히말하면 한국에서 먹는 상그리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도 맛있으니까. ^^
시간이 10시가 다되었는데도 식당은 만원이다.
드디어 나온 해물 빠에야. 낄낄 맛있게 저걸 2인분을 혼자서 다 먹었다. 결국 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덕분에 11시가 다 되서야 가게를 나설 수 있었다. 맛은? 내가 요리왕 비룡이 아닌지라 이 맛을 표현하긴 힘들지만, 일단 Bouillabaisse보다는 맛있었다. (한국사람은 역시 밥인가?) 그리고 일단 발이 쉬니까 편해서 참 좋았다. 그래서 11시 반이 다 되어서 께롱께롱한 상태로 숙소에 도착했다. 지하철 한번 탄 이후로 계속 걸어다닌 덕에 대충 하루에 15km는 걸어다닌 느낌인데, 여행 내내 그정도는 아니어도 계속 걸어다닌 지라... 사실 요즘 이렇게 걸어다닌 적이 없으니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뭐 별수 없이 조금 안정을 취하고 다시 내일 또 움직여야한다. 물집은 터뜨렸는데. 흠. 내일 뭐 아프면 잘 조절하면서 다니면 되지.
'Discrete > 12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aris: jour 1 - 1er, 8è, 16è (Elysées à Eiffel) (0) | 2014.01.12 |
|---|---|
| caminar, caminar, caminar. (0) | 2013.12.02 |
| Une bonne façon de finir à Marseille (0) | 2013.10.23 |
| Un voyage à Provence (0) | 20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