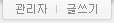Paris: jour 1 - 1er, 8è, 16è (Elysées à Eiffel)
그렇게 난 복권의 도시 Barcelona를 떠날 준비를 했다. (정말 가판대마다 복권을 팔고 있는 도시. 사실 여행다닌 도시들 중 서울이랑 가장 비슷한 도시인 것 같다.) 아침 10시 비행기인 관계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챙겨서 러시아워 속에서 공항으로 가는 Renfe에 몸을 실어야했는데, 공항으로 가는 Renfe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 나름의 쳇바퀴에 맞추어 잘 설계를 했는데, 역시나 러시아워 속에 Renfe가 시간에 맞추어서 다닐 리가 없다. (지하철은 초단위로 시간이 가던데.) 열차를 갈아타야하는데. 그러나 서둘러서 플랫폼으로 간 Sants(꼭 용산역처럼 생겼다.)에 갈아타야할 열차도 똑같이 늦게 와주시는 아름다움 속에서 난 무사히 공항으로 갈 수 있었다. 사실 갈아타려고보니 같이 가기로 한 효은이가 앞에 서있어서 마음이 급속히 편안해졌다.
공항에서도 같이 서 있는 효은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늦어서 그런건지) 제일 앞자리를 가운데를 비워서 티케팅을 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셨다. (저가항공 Vueling의 센스에 감탄.) 여튼 면세점에도 무관심해진 관계로 공항에 적당히 들어가 앉아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면서 맥북을 열었다 닫았다 사진을 옮긴다 만다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한지 15분이 남았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물론 난 자리가 정해진 자리가 있으면 열에 아홉으로 미리 줄을 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 마지막 순간이 되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Paris행 비행기 게이트 앞으로 줄이 쫙.
떠나는 날까지 맑은 이 날씨. Goodby3, Barcelona!
2시간의 비행동안 과자도 나눠 먹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이제 저 멀리 Tour Eiffel이 보이는 이 도시에 도착했다. 보통 사람들은 CDG에 내려서 파리 시내로 들어가지만 이번 여정에서 난 ORY in, ORY out을 선택했다. ORY는 파리 남쪽에 있는, 서울의 김포공항과 같은 존재다. 도시 외곽에 있던 공항이었던 Orly가 규모를 확장해야하지만 이제 주위가 개발로 인해 꽉 차면서 확장이 불가능해진 관계로 이를 대신해서 대형공항인 CDG를 다시 건설해서 대다수의 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CDG로 오지만, 국내선을 비롯한 몇몇 노선은 Orly로 온다. 그래서 시내에서 접근하기는 좀 더 가까운 공항이다.
물론 가까운거지 그리 편하지는 않다. 일단 지하철 7호선의 종착역인 Villejuif - Louis Aragon까지 가려면 버스로 환승을 해야하는 관계로 짐을 찾아서 그 시내버스 정류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정류장에 가려소 버스를 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모르는 프랑스어로 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역에 엘레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결국에 지하철을 타고 올라갈때도, 내려갈때도 내가 이 트렁크 2개를 들고 오르락내리락해야한다는 현실에 마주해야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내 숙소가 7호선이어서 난 공항에 올 때, 갈 때 환승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걸 들고 다시 어딜 갈 필요는 없었다는 데에 있다. 여튼 7호선 종점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에서 트램 공사를 하느지 길 한 차선이 통째로 공사중이었다. 여튼 친구는 트렁크의 손장비가 고장이었고, 난 트렁크가 2개니 서로 도와주긴 힘든데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여튼 지하철에 무사히 타고 무사히 내렸다. 물론 Sortie에서도 문을 못 열고 있었다. 파리시민들의 팔힘은 지하철 출구에서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효은이랑 바이바이를 한 뒤에 난 예약했던 숙소에 전화를 했다. 그러니 갑자기 쓰러져갈 것 같은 문이 열리고 날 픽업하러 와주었다. 다행히 역에서 가까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엘레베이터가 없다. 숙소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다가 철제 침대에 빨래를 널만한 곳도 딱히 없고, 화장실도 그리 좋아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7명이 묵는 숙소지만 대충 4명만 묵는 것 같으니 겹치지만 않는다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다. 여튼 짐을 일단 풀으면서, 난 Christopher's Inn에 아직 미련이 남아서 일단 여기서 이틀을 묵는다고 구두로 말을 해놓았다.
그리곤 다시 carnet을 들고 숙소를 나와 길을 나섰다. 일단 어디로 향해야할지 모르겠으니 시내에 있는 Visitor's office에 갔다. 바로 7호선을 타고 Pyramides에서 내린 뒤 주위를 둘러보면 된다. 일단 여기서 지도 한장과 Museum Pass를 사서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으면 (Google Maps와 함꼐하는 즐거운 여행) 왼쪽에서는 Musée de Louvre, 오른쪽에서는 Jardin des Tuileries가 나를 반긴다. 사실 둘다 옛날에는 궁전이었는데, 한 성깔하시는 파리 시민님들의 그 유명한 Paris Commune1때 불타서 왼쪽은 대충 복구하고, 오른쪽은 복구를 못해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은 루브르 박물관이 됐고,
이쪽은 튈르리공원이 된 거란다.
저기 보이는 게 조그만 개선문. 참고로 이 길을 쭉 따라서 서쪽방향으로 Louvre - Carrousel - Tuileries - Concorde - Obélisque - Champs-Elysées - Arc de Triomphe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다.
맑은 파리 하늘 아래의 튈르리공원. 사진 가운데 저 멀리 있는 것이 오벨리스크와 개선문이다. 가까이에는 원형 분수가 자리잡고 있다.
시선을 잠시 좌우로 돌리면 푸른 잔디와 꽃밭이 여유로운 정원의 느낌. 그런데 파리 시민인지 관광객인지 모를 사람이 엄청 많다. 사실 사람만 보면 마치 구엘공원에 온 느낌이랄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진찍는 사람보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소소한 느낌도 사뭇 느껴진다. 놀이공원에 온 느낌이다.
그냥 높게 뜬 태양을 즐기면서 햇빛 아래에서 그냥 수다떨으라고 분수 주위로는 의자가 동그랗게 놓여져있다.
파리는 도시라서 그런지 공원 한적한 곳에도 회전목마가 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회전목마 사랑.
그렇게 튈르리공원을 지나면 콩코르드 광장이 나온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큰 오벨리스크가 가운데에 떡하니 서있다. 가까이 가봐도 사실 저기에 쓰여있는 건 상형문자고 위로 굳게 뻗어있는 오벨리스크의 특성상 그냥 오 크다. 이정도의 느낌이 전부다.
사진을 찍으면서 한발짝씩 파리를 걸어다니면 이제 앞으로 사각형으로 가지가 잘린 나무들과 개선문이 나를 반긴다.
그 유명한 샹젤리제거리. 늪지대였던 이 주변을 흙으로 덮어서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지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파리 관광의 중심이고, 그 유명한 노래 'Aux Champs Elysees'가 말하는 곳이 이 거리다. 사실 정말 걸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주위로 패션, 명품 가게들도 수없이 있고, 관광객도 진짜 많다.
대한민국 명품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이른바 입문형 상품인 3초백의 시작 LOUIS VUITTON의 본점 건물이다. 이 비싼 땅값의 곳에서 이걸 다 쓰고 있는건가?
그렇게 마침내 도착한 거리의 끝, 개선문. 거리의 끝이기도 하고 개선문 근처라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다. 다들 거리 모서리에 모여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를 반복한다.
이미 너무 유명한 개선문 주위는 원형 교차로로 개선문을 중심으로 12방향으로 사방으로 길이 나있다. (방사형 도시구조의 표본이다.) 특히 개선문은 주위가 원형교차로이므로 길을 건널 때 건널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통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지금 사진을 찍은 이쪽이 사실상의 입구라도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개선문은 승전기념비의 일종이다. 그래서 무명용사에 대한 헌화가 이어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물론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한 이름과 그림이 개선문을 빼곡히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통제되기 시작한다. 뭐지뭐지?하고 지켜봤더니
매일 시들지 않는 꽃의 비결,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기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람 많던 곳이 한번에 통제되고 텅 비었다.
정말로 무장한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아무래도 시위나 테러 예방을 위한 목적이 강한 것 같다.)
샹젤리제거리를 절반을 통제하고 앞쪽으로는 헌화를 할 사람들이 걸어온다.
그 뒤로는 의장대가 쭉 걸어오는데, 다들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광경.
나이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구분없이 헌화 행렬에 포함 되어, 자국 프랑스를 지킨 무명용사들에게 예를 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일에서나 하는 행사를 여기서는 매일 하고 있다니. 그러고보면 이 나라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꾸준하게 전투가 이어진 나라였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행사를 하기 적당한 위치가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을까? 이순신장군 동상 앞?
그렇게 행사를 보고는 오늘 마지막 종착지인 에펠탑을 바라보기 위해 Trocadéro로 향했다. 바로 에펠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대충 지도로 보았을때나 가이드북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위치가 에펠탑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었다. 에펠탑에서 Seine을 건너면 Palais de Chaillot가 있고 사실상의 에펠탑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트로카데로 정원에서 에펠탑을 바라본 순간, 난 그냥 말문이 막혔다. 아니, 이보다는 우와! 하는 느낌과 함께 그냥 얼어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여행을 20일 넘게 다니면서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냥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광장의 계단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서있는 에펠탑을 바라보았다.
저녁시간에 도착하니 바깥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지만, 하늘에 펼쳐진 분홍색 노을과 어우러져서 마치 하늘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변했다.
해가 뉘엇뉘엇해지자 저 멀리 있는 회전목마에도 불이 켜지고 에펠탑의 조명에도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냥 난 그냥 앉아서 셔터만 눌렀다.
드디어 완전히 해가 떨어졌다. 해가 떨어진 뒤 정시마다는 조명 쇼가 펼쳐진다길래 그래서 꿋꿋하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막 반짝이더니 끝나버렸다. 어 이건 홍콩에서 보았던 빛의 심포니와 비슷한 요상한 느낌인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걸 나중에 귀국한 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것까지 예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중을 위해 준비한 반짝쇼 동영상.
그렇게 예쁜 에펠탑을 1시간동안 바라본 뒤 난 파리에서의 첫째날을 마무리했다.
지구상 가장 밀도 높은 지하철노선이라는 파리 지하철로 숙소 근처의 Crimée에 도착해서 아직 미련이 남은 Christopher's Inn에 방문해보니 숙소 근처에 우와. 운하가 있다. 아 지도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 나도 여기에 잡을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운하 곁이라서 약간 온도가 낮다고는 했다.) 뭐 여튼 자리가 없다는 말만 듣고 쓸쓸히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 파리 코뮌이란 파리에 잠시 있었다가 사라진 사회주의 정부를 말한다. [본문으로]
'Discrete > 12 Europ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aris: jour 3 - Flâneur (2) | 2014.08.26 |
|---|---|
| Paris: jour 2 - L'Art (1) | 2014.01.29 |
| caminar, caminar, caminar. (0) | 2013.12.02 |
| ¿Barcelona en España? Barça a Catalunya! (0) | 2013.11.18 |